어제 갑자기 일하다가 죽을것처럼 졸려워졌다. 이런 일은 간만이었는데, 마우스에 걸쳐 있는 손가락에도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나는 그만 조용히 뒷일은 생각도 안하고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두번에 걸쳐 꿈을 꾸었다.
첫번째 꿈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두번째 꿈은 버스에서 내려보니 전혀 낯선 곳이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아마도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친 모양이다. 그러나 (이미 숱하게 종점까지 가 본 나로서는) 이 곳이 너무나도 낯설다. 내가 버스를 잘못 탄건가? 일단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건달들,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여고생들, 아줌마, 회사원… 누군가에게 여기가 어딘지를 물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달들에게 다가가 “저 아저씨,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술을 마시고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친 모양인데…”. 그들은 건달식 전문용어로, 걸걸하게 웃으며 X니 Y니 거센 말을 내뱉는다. 그러다 ‘형님’으로 보이는 이가 “여긴 경포대요, 경포대.”. 젠장. 뭔 버스를 탔길래 서울에서 경포대까지 온건지 정신이 혼란스럽다. “저 그럼 저희집 쪽으로 가려면…?” 하니까 형님이 길 반대편을 가리킨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 다음에 천천히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보안등이 껌뻑이며 아침을 맞는 어느 산동네의 어귀에 다다랐다. 하늘이 한쪽으로부터 푸르게 밝아오고 가끔 잠이 깬 개가 컹컹이며 짖는다. 또 하루의 노동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집들의 창문엔 하얀 형광등빛이 밝았다. 그러다 허름한 문방구 앞을 지난다. 새벽인데도 벌써부터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열린 미닫이 유리문 사이로 문방구에 달린 조그만 단칸방의 내부가 보인다. 잠에서 덜 깬 아이는 칭얼대며 이불을 껴안고, 아버지는 까치집 지은 머리로 아침뉴스가 나오는 티븨를 본다. 제일 바쁜건 엄만데, 벌써부터 부엌에서 밥을 짓는다 애들을 깨운다 정신이 없다.
바람이 시원하다. 왠지 그 아이가 낯이 익다. 십년 전엔 우리집도 문방구를 했는데, 하는 기억이 잠깐 머리를 스쳤다.
그렇게 길을 따라 걷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산동네의 전경이 눈 앞에 펼쳐진다. 집들이 바위에 붙은 따개비처럼 조밀하게 들어서 있다. 오른쪽으론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하는 수평선이 보인다.
그러다 산 밑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들고 올라오는 아주머니가 보인다. 나는 아주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멋적은 표정을 지으며 길을 묻는다.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구… 제가 버스에서 잘못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집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머니는 처음엔 날 경계하다가 길을 묻는 부분에 이르자, 걱정스런 표정으로 날 잡아 자기 집으로 이끈다. 영문도 모르고 난 그녀를 따라간다.
길 가에 난 나무 문을 열면 바로 백열등이 달린 부엌이고 그 부엌 안쪽에 시멘트로 만든 계단을 몇 개 더 오르면 서너평 정도의 방이 있는 그런 집이다. 아주머니는 그 방으로 올라가 아이들을 깨운다. 아주머니를 따라 집안까지 들어가기가 그래서 잠시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바다쪽을 보았는데 옅은 분홍빛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고깃배들이 평화롭게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인다. 모든 것이 순간 아득하게 빛났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물이 났다. 이미 그 곳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었거나, 어머니의 땅이거나, 극락세계가 되었다. 너무나 광경에 압도되어 감동이 생기지도 않았다. 마음이 티끌도 없이 무한하게 비워졌고 비워진 만큼 계속해서 분홍빛 안개가 채워졌다.
이윽고 아주머니가 세숫대야를 들고 방에서 나온다.
“왜 울었어?”
“그냥요… 그냥 모든게…”
“조용히 해…”
아주머니는 세숫대야에 담긴 물로 정성스럽게 내 눈을 닦아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도 계속 아주머니가 내 눈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났다.
여기서 잠이 깼다. 일어났더니 정말 자는 동안 울었는지, 눈꼽이 많이 껴 있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꿈 내용을 머리 속에 떠올렸다. 그 신선한 풍경들을 그림으로 옮기고 싶었는데, 막상 머리 속에선 그렇게 선명하던 풍경들이 종이를 앞에 두고는 조금도 풀려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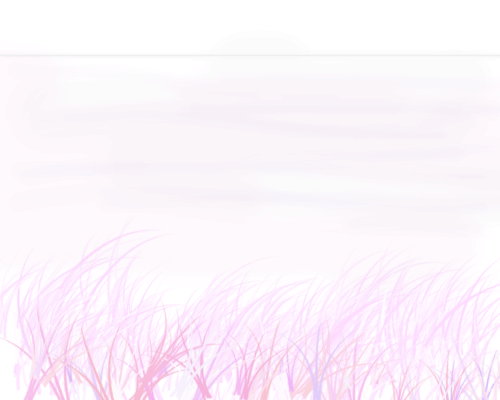
이 노래가 생각났다.
꿈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노래.
Jorge Drexler – Al Otro Lado Del Rio ‘모터 싸이클 다이어리 OST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