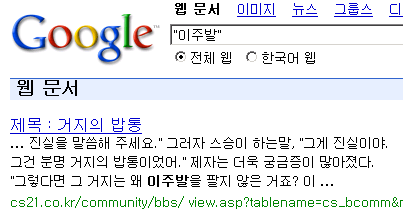카메라가 없을때, 나는 매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것은 물론 글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왠지 글에는 나의 어떤 욕망같은게 투사되는 듯 하여서 몇 번 메모하다가 말았다. 마치 땅거미가 질 무렵에 점점 깊은 명도로 희석되는 피사체 같은 기분이었다. 자꾸만 ‘원래 거기 있던 것’들은 희미해지고 마지막엔 잘 분간되지 않는 뿌연 욕망만 남았다.
내게도 카메라가 생겼다. 2006년 물가를 감안해, 짜장면을 거의 500그릇 이상 먹을 수 있는 돈이 들어갔다. 내가 스스럼없이 나의 어떤 것을 위해 쓴 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였다.
참 이상한 일이다. 카메라가 생기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싶던 순간들이 잘 기억나질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울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던 그 서글한 눈매였던가 아니면 따뜻한 촉감의 스웨터였던가 하는 것이다. 어쩌면 쨍알대는 톤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목소리는 사진으로는 남길 수 없다.
누가 쓴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예술에 관한 어떤 아티클이 있었다. 아마 10년전에 컴퓨터 관련 잡지에 실린, 디지털 아티스트가 쓴 것이었다고 아주 힘껏 짜내어 기억해 본 바로는 그렇다. “形은 色을 능가해야 한다.” 별로 무엇을 찍어야 하나, 나는 뭘 원하는가 따위를 고민하다가 가까스로 떠올린 단 한 문장이었다. 그것은 운이 좋으면 내 초라한 취미생활에 어떤 화두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을꺼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내게 미니멀리즘적인 취미는 없다.
다시 이야기 하고 싶다. 짧게 얘기해서 기록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남기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창작물은 사실 과거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내가 무슨 거창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처럼 보여서 매우 흡족하다. 빈약한 인간은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위안해야 시린 뼈를 녹여서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는 겨울이 매우 싫어졌다.
어젠가 그젠가 워녕이놈과 지난주에 보기로 했던 ‘다섯개의 시선’을 봤다. 오프닝 화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로고가 떠오르자 – 다섯개의 시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왠지 재미도 의미도 없는 공익영화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고 영화 자체는 매우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무튼 꼭 보시길 바란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고 장진감독을 매우 좋아하기로 했다. 임순례감독이 깜짝 까메오로 출현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선 모든 관객이 뒤집어지고 말았다.
마지막 글로부터 나는 당분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후로도 두서너번 술을 마셨다.
학교를 그만 두기로, 결국 결정했고 부모님께 (아직 어머니한테만) 말씀을 드렸다. 한참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 그 첫번째는 이 양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하나 없을 뿐더러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느냐, 라는 역질문은 이 경우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내가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내 결심을 포기하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나는 어머니를 이해한다. (나는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서 일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녀가 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며, 노무현을 씹어 먹을듯이 증오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정말 이제는 이해 할 수 있다.) 전혀 화는 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다. 두번째는, 나조차도 내가 하려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 몇달간 생각한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중엔 슬슬 웃음도 나왔다. 어쨌든 어머니는 개강 전까지 좀 더 생각해보자고 하셨다. 물론 나는 더 생각할 것이다.
얕은 연못은 가벼운 바람에도 일렁인다. 그러나 바람이 잠시 약해지면 또 금방 잠잠해지기도 한다. 깊은 호수는 심한 바람에도 잠잠하지만, 한번 일렁이기 시작하면 바람이 약해져도 계속 일렁인다.
방금 생각났는데, 다섯개의 시선을 보고 저녁 겸 간단하게 원영이와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 녀석이 “물론”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물론”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반론을 미연에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며, 어쩌면 철학과 다녔다고 티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막 웃으면서, 나도 블로그에 낙서하면서 물론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했으며 대개의 경우 네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쓰임을 의도했다고 고백했다. 물론 아닐때도 있다.
나는 이제 점심을 먹고 미뤄두었던 일을 할 것이다. 오랫만에 라면을 먹을까 한다. 아무도 없는 정오, 어두운 반지하 주방에서 불도 안켜고 라면을 끓이는데에 나는 완전히 달인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