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밤늦게 담배를 사러 간다. 길을 걷다 모퉁이, 쓰레기더미 사이에서 늦은 저녁을 해결하려는 검은 고양이 한마리를 만났다. 고된 식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까치발로 살금살금 돌아가려는데, 그만 슬리퍼가 아스팔트에 길게 끌리는 바람에 고양이가 흘끔 나를 돌아본다.
“저, 나는 그냥 담배사러 가는 길이니까 그냥 계속 먹어도 돼. 장난치지 않을게.”
고양이는 내 말의 진위를 따져보려는 듯이 날 한참 노려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식사에 열중한다. 가끔 딱딱한 뼈다귀라도 씹는지 우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까치발로 조심스럽게 모퉁이를 돌아간다.
“모든 사람이 너만큼만 조심했으면 좋으련만.”
“뭐라고?”
고양이가 말을 했다.
“너만큼만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네가 말한거야?”
“그럼 여기 나 말고 누가 있는데?”
“분명히 니코틴 금단현상일꺼야. 빨리 담배를 사러 가야지…”
나는 갑자기 무서워져서 후다닥 슈퍼로 뛰어가 디스플러스를 샀다. 가게를 나오자마자 담배를 한 대 빼어 물고 불을 붙였다.
“아무래도 요즘 너무 무리하는걸까.”
다시 왔던 길을 되밟아간다.
“이봐, 놀란거야?”
흠칫.
“뭘 이런걸로 놀라고 그래. 로켓을 쏴서 화성까지 보내는 시댄데, 고양이가 말 좀 한다고 해서 놀라 후다닥 뛰어갈 필요는 없잖아?”
쓰레기 봉투 위에 얌전히 앉아 있는 고양이.
“이리 와 봐. 사람은 안잡아먹어.”
나는 홀린듯이 고양이에게로 다가간다.
“담배 산거야? 뭐 샀어? 디스플러스?”
“..으, 응.”
“한 대 줘봐. 식후땡.”
불을 붙여 담배를 건냈다. 저 고양이발로 과연 담배를 집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뭐 어떻게 잘 피우고 있다.
“다음부턴 레종 피워. 그거 한 갑 피우면 우리 고양이들한테 1퍼센트씩 모델료가 떨어지거든.”
“그건 좀 비싼데…”
“시끄럽고, 피우라면 피워. 알겠어?”
“응. -_-;;”
“너 저 위에 화평빌라 다동에 사는 애지? 맨날 밤새도록 불켜놓고 있는.”
“응.”
“애들이 가끔 네 얘기 하더라. 너 언젠가 네 창문가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먹을거 줬다면서?”
“몇 번.”
“네 마음은 잘 알겠는데, 우리 고양이들도 프라이드란게 있다구. 우린 스스로 구하지 않은 먹이는 먹으면 안돼.”
“그 고양이는 잘 먹던데.”
“그때 걘 임신중이어서 뭐든 질 좋은걸 먹어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거였고, 아무튼 주지 말라면 주지 마.”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놔서 맨날 아줌마들이 골치아파한데.”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꽁꽁 싸매놓은걸 이 손으로 어떻게 풀란 말야. 인간들은 참 웃기다. 어차피 버릴꺼, 뭘 그렇게 매듭을 지어 놓는거야? 버리는건 편하게 버리라구.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건 다 먹어치울테니까, 나머진 새벽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가져가겠지.”
“사람들은 그걸 예의라고 생각해. 쓰레기봉투를 꽉 매듭지어 놓는거.”
“정말 예의를 지켜야 할때나 지키라고 해. 나는 인간들이 쓰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데, 이 골목 고양이 대장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신문인가 하는걸 읽더라구. 대장이 그러는데, 니들은 정말 필요할 때엔 무신경하고 불필요할때에만 열심이라고 하더군.”
“할 말은 없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게 예의야.”
“너는 이름이 뭐야?”
“고양이는 이름이 없어. 그냥 고양이지.”
“너는 다른 ‘너희’들과 어떻게 네 자신을 구분하니, 그럼?”
“왜 구분을 해?”
“불편하잖아, 그런건… 누굴 불러야 할때도 그렇고.”
“누굴 불러야 하면 그 녀석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돼.”
“아무리 그래도…”
“우리 고양이는, 하나하나가 모두 고양이면서 총체적으로도 모두 고양이야. 부분과 전체가 통일되어 있는거지. 우리는 집단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면서, 존중받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디에서나 같아.”
“밤에 자지 않고 있으면 너희들도 꽤 싸우던데…”
“발정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구.”
“발정.”
“그래, 발. 정.”
담배를 다 피워서, 고양이는 꽁초를 땅에 그냥 버리더니 발로 능숙하게 비벼 껐다.
“안뜨거워?”
“뜨거워.”
“대단하시군.”
“뭐, 별로.”
바람이 불자, 나무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
“내가 내키면.”
“있잖아, 언제라도 배가 고프면 내 방 창가로 와서 먹이를 구해가.”
“누가 주는건 안먹는대도.”
“나는 그냥 버릴테니까, 그 뒤는 알아서 하라구.”
“너 이자식, 머리 쓰는거냐?”
당황.
“아니, 난 그냥…”
“심심하면 놀러갈께. 먹이 따윈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괜히 걱정해줄 필요 없어.”
“그래, 그럼.”
“이제 가.”
“알았어. 잘 지내.”
“너도.”
두서너 걸음 걷다 말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미 고양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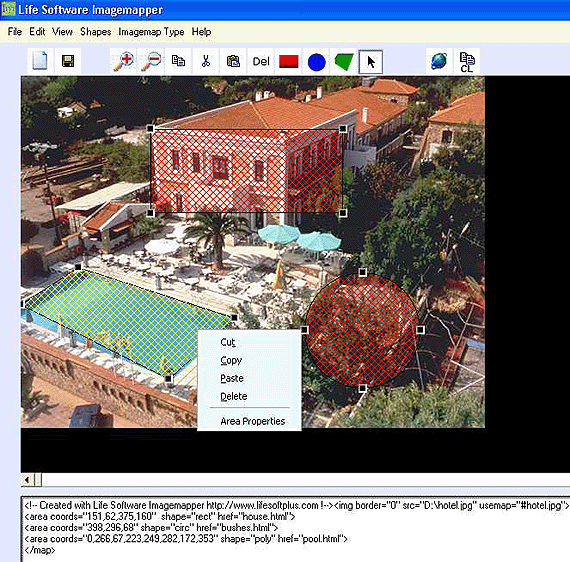 그런데 정말 이해불가능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 Life Software Imagemapper V1.0 라는 것인데, 스크린샷으로 보아하니 기능도 매우 심플하며, 별다른 툴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설치파일이 7.32Mb나 됐다. 나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단순하게 이미지맵을 생성하는 주제에 왜 7.32Mb나 되는 용량을 가져야 하는지 쉽게 납득 할 수 없었다. 설마 인스톨러만 한 6메가 되는걸까? (이것도 웃기다.) 아니면 자동으로 군사위성을 해킹해서 누드비치를 세밀하게 촬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도 포함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걸 깔면 번들로 라이트 버젼의 드림위버라도 함께 깔리는 것일까? 정말 모르겠다. 왜 이게 7메가가 넘는 설치파일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데 정말 이해불가능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 Life Software Imagemapper V1.0 라는 것인데, 스크린샷으로 보아하니 기능도 매우 심플하며, 별다른 툴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설치파일이 7.32Mb나 됐다. 나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단순하게 이미지맵을 생성하는 주제에 왜 7.32Mb나 되는 용량을 가져야 하는지 쉽게 납득 할 수 없었다. 설마 인스톨러만 한 6메가 되는걸까? (이것도 웃기다.) 아니면 자동으로 군사위성을 해킹해서 누드비치를 세밀하게 촬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도 포함된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걸 깔면 번들로 라이트 버젼의 드림위버라도 함께 깔리는 것일까? 정말 모르겠다. 왜 이게 7메가가 넘는 설치파일을 가져야 하는지.